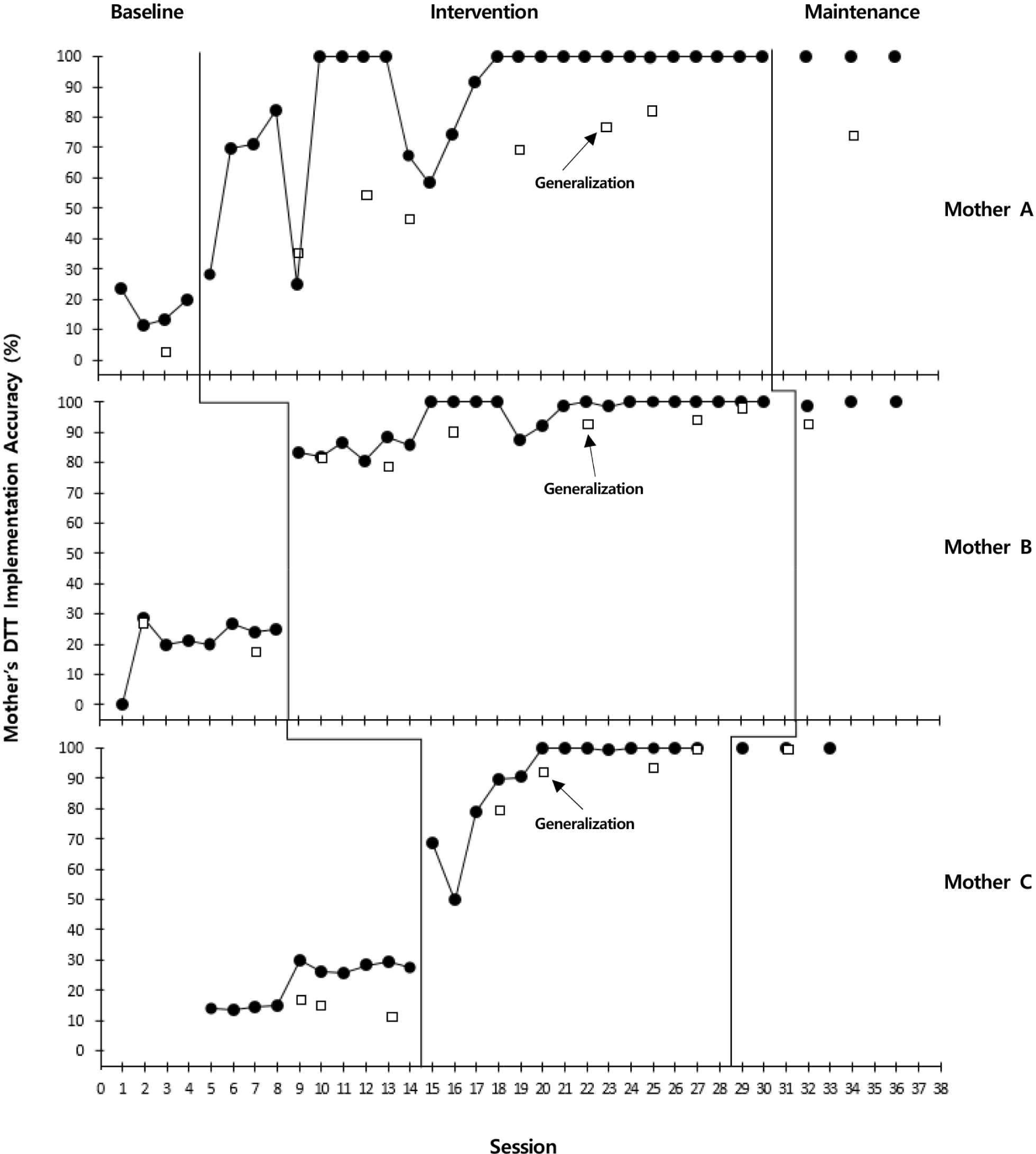Ⅰ. 서론
자폐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의 출현률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24)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6명 중 1명의 아동이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64%에 달하는 높은 출현률이 보고되었다(Sunwoo et al., 2017).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조기 진단 및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수를 확대시키며, 이에 따라 중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폐성 장애 진단까지의 평균 연령이 4-5세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진단 대기 기간이 9-12개월에 이르러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Zuckerman, Lindly & Sinche, 2015).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력 부족과 제한된 운영 여건으로 인해 중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Hodgetts, Zwaigenbaum & Nicholas, 2015; Wise et al., 2010),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 기반 중재 서비스와 학교 기반 특수교육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Kim et al., 2019). 이와 같은 서비스 부족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Lavelle et al., 2014).
자폐성 장애는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로, 아동의 언어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적응적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Lord et al., 2018). 특히 의사소통 기술의 결핍은 단순한 언어 발달 지연을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학습 참여를 제한하며, 이는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igsti et al., 2011; Tager Flusberg, Paul & Lord, 2005). 또한 자폐성 장애 아동은 언어적 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한계는 문제행동이나 좌절 반응으로 표출되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Chiang, 2008). 따라서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있어 초기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중재는 매우 중요하며,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Estes et al., 2015; Franz et al., 2022).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언어 및 사회적 기술 등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 기반 중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Makrygianni & Reed, 2010; Reichow, 2012). 이러한 응용행동분석 기반 중재는 교사 주도로 명확한 자극-반응-강화 절차에 따라 과제를 구조화하는 구조적 접근과, 아동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비구조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접근에는 개별시도교수(Discrete Trial Training; DTT)(Lovaas, 1987)와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PECS)등이 있으며(Cooper, Heron & Heward, 2007), 비구조적 접근에는 자연주의 발달 행동 중재(Naturalistic Developmental Behavioral Interventions; NDBI)에 기반한 조기 시작 덴버 모델(Early Start Denver Model; ESDM) (Rogers & Dawson, 2010)과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eatment; PRT)(Koegel et al., 1999)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최근 자연주의 중재는 아동 주도의 상호작용과 일상적 맥락 속 교수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자발성을 촉진하고 기술의 일반화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Frost et al., 2020; Schreibman, et al., 2015). 이러한 접근은 개별 아동의 흥미와 일상 상황을 기반으로 중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하고 아동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재자 간 실행의 일관성이나 중재 충실도 유지가 어려운 점이 보고되었다(Stahmer, Schreibman & Cunningham, 2011; van Noorden, Gardiner & Waddington, 2024). 더불어 자연주의 중재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의사소통, 자발적 상호작용, 부적응 행동 감소 등 여러 영역에서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Oono, Honey & McConachie, 2013; Sandbank et al., 2020; Tiede & Walton, 2019; Trembath et al., 2023). 이러한 점은 자연주의 접근이 특정 기술 습득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시사한다.
반면 개별시도교수는 자극-반응-강화의 구조화된 절차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기 언어 및 기능적 반응 형성에 효과적인 중재로 평가된다(Smith, 2001; Sundberg & Partington, 1998). 특히 언어 행동 초기 단계의 아동에게는 일관된 자극 제시와 명확한 강화 체계가 필요하므로, 개별시도교수의 구조적 특성은 이러한 발달적 요구에 부합한다(Leaf et al., 2016; Lovaas, 1987; Smith, 2001). 또한, 개별시도교수는 수용•표현 언어, 사회적 행동, 놀이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며,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Leaf et al., 2018; Reed et al., 2011; Weiss, Hilton & Russo, 2017).
그러나 개별시도교수는 주로 전문가 주도의 구조화된 임상 환경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아동이 습득한 기술을 실제 생활에서 유지하거나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Buescher et al., 2014; Ganz & Simpson, 2004; Johnston et al., 2003; Sutherland et al., 2019).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부모 중심 중재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Roberts & Kaiser, 2011), 실제로 자폐 아동을 위한 조기 지원 프로그램에 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은 연구와 임상 지침에서 권장되는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Leaf et al., 2019;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2001). 부모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자연스러운 중재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Lovaas, 1987; McEachin et al., 2018; Oono et al., 2013), 이러한 특성은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개입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가 중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녀의 학습 효과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습득한 기술의 유지와 일반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 Shin, 2019; Lee & Kim, 2022; Shin, Park & Lee, 2021; Wetherby & Woods, 2006; Wetherby & Woods, 2008; Zwaigenbaum et al.,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별시도교수는 명확한 절차와 강화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모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 중심 중재 맥락에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 전략으로 평가된다(Crockett et al., 2007; Eikeseth, Smith, & Klintwall, 2014). 실제로 Crockett et al.(2007)은 부모 대상 개별시도교수 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의 중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기능적 기술이 다양한 환경에서 일반화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모 교육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Sallows and Graupner(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 중심의 개별시도교수 중재가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동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개별시도교수 전략을 학습하여 가정에서 직접 적용할 경우, 개별시도교수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수 구조를 통해 아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이는 습득한 기술의 유지와 일반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Brian et al., 2017; McIntyre & Zemantic, 2017; Shin et al., 2021; Wallace & Rogers,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들의 개별시도교수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가정이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부모가 직접 중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일관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부모는 교사나 치료사와 달리 전문적인 중재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침만으로는 중재 수행의 정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Noh, 2014).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는 텔레코칭(telecoaching)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텔레코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모에게 중재 기술을 지도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학습과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원격 중재 방법이다(Azzano et al., 2022; Meadan, Lee & Chung, 2022). 특히, 부모에게 중재 실행 전략을 코칭하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전달 모델로 제안되고 있으며(Shalev, Lavine & Di Martino, 2020), 텔레코칭은 이러한 장점을 잘 반영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텔레코칭은 부모와 전문가 간의 물리적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 중재 기술을 습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그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Azzano et al., 2022; Douglas et al., 2021; Kane & DeBar, 2022; Lee & Paik, 2023; Lindgren et al., 2016; Meadan et al., 2022; Simacek et al., 2021; Wainer & Ingersoll, 2015).
국내에서 텔레코칭을 활용한 부모 중재 연구는 주로 아동의 문제행동(Choi et al., 2024; Lee & Hong, 2021; Lee & Paik, 2023), 부모의 양육 효능감 증진 및 스트레스 (Choi et al., 2023; Lee & Paik, 2023),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Lee, J. Y. & Lee, S. H., 2020; Nam & Lee, 2024; Yoon & Han, 2021)에 초점을 두고 있다. Nam and Lee(2024)의 연구에서는 놀이 중심 자연발달 행동중재(NDBI)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 아동과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전문가의 가정방문과 원격 방식을 병행하여 텔레코칭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Lee, J. Y. and Lee, S. H.(2020)는 앱과 SNS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부모-자녀 상호작용 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나, 실시간 텔레코칭이 포함되지 않아 부모가 중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하거나 피드백을 제공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국내에서 실시된 실험연구 중 Lee and Paik(2023)은 실시간 텔레코칭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와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텔레코칭이 부모의 중재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며, 특히 구조화된 중재 전략인 개별시도교수를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텔레코칭을 통한 부모 중재가 아동의 과제 수행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실험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레코칭에 의한 가정 기반 부모 중재가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텔레코칭에 의해 개별시도교수 절차를 교육받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의 초기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하는 핵심지표인 모방(imitation), 에코익(echoic), 청자반응(listening response), 인트라버벌(intraverbal) 과제 수행을 직접 중재하도록 하였다. 즉, 행동분석 전문가가 부모에게 개별시도교수 절차를 교육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폐성 장애 자녀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적용하였을 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텔레코칭 기반 부모 훈련에 따른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 3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 아동 부모가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연구 모집 안내문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들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3쌍의 어머니와 아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만 4세 이상 아동 중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둘째, 행동 분석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예: DTT, ESDM 등)을 정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 셋째, 중재 과정에 방해가 될 심각한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이 없는 아동, 넷째, 개별시도교수 중재 절차를 변별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을 갖춘 아동, 다섯째, 어머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중재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갖춘 경우이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3시간 이상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로서, 응용행동분석 관련 부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어머니 A는 유치원 교사로서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자발적 발화 부족과 지시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어머니 B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자녀의 발화가 맥락에 맞지 않아 일상적인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어머니 C는 물리치료사로서 아동 발달과 관련된 치료 경험은 있으나, 자녀의 지시 따르기 및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 어머니 모두 자녀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중재 방법을 배우고자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어머니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 아동은 한국판 아동발달검사(K-CDI), 한국판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K-CARS2-ST),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SIB-R)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전반적인 발달 지연과 함께 일상생활 전반에서 빈번한 지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A는 발달 연령이 생활연령에 비해 현저히 낮고,1음절 발화가 어려우며, 사물을 활용한 모방 수행에 제한이 있었다. 아동 B는 3어절 문장 표현이 가능하였으나,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발화나 혼잣말이 자주 관찰되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반응이 제한적이었다. 아동 C는 기본적인 문장 표현이 가능하였으나, 요구가 좌절될 경우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하는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났으며, 지시에 대한 반응이 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참여 아동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개별시도교수 중재 수행을 위한 기초 기술은 사전 평가를 통해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 아동의 기본 정보는 <Table 2>와 같다.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 2nd Ed. (K-CDI): Interpreted as borderline (-1.5 to -2.0 SD) or delayed (-2.0 SD and below) (Kim & Shin, 2010)
Korean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Second Edition (K-CARS2-ST): Scores interpreted as autism risk (≥30), medium risk(30-36.5), or high risk (≥37) (Lee, Yoon & Shin, 2019)
Social age indicates the equivalent age score reflecting the child’s performance compared to same-age peers.
K-CDI는 15개월부터 6세 아동의 발달 수준을 부모 보고 방식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사회성, 자조기술,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언어 이해 및 표현, 문자•숫자 인지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판 아동 발달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α= .95로 보고되었다(Kim & Shin, 2006).
K-CARS2-ST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및 중증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관찰, 부모 면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15개 항목에서 자폐 특성을 점수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폐 진단 여부와 주요 증상 수준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중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한국판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 2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α= .77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24).
K-SIB-R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기능적 독립성과 적응행동을 평가하는 도구로, 운동기술, 개인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사회 기술, 문제행동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기능과 중재 참여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중재 환경 구성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국판 적응행동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α= .99로 보고되었다(Paik et al., 2007).
VB-MAPP는 발달 이정표(milestones)와 행동 분석 원리에 기반하여 아동의 언어 및 사회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중재 목표 설정에 활용되는 도구로, 주요 언어 행동 영역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Sundberg, 200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현재 언어행동 수준을 분석하고, 중재 목표 과제를 선정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하였다.
텔레코칭을 통해 어머니가 가정에서 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할 때, 연구자가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 가정의 각 방에 홈 CCTV를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코칭 장치로 ‘U+ 스마트 홈 CCTV’인 ‘슈퍼 맘카1)’를 활용하였다. 이 홈 CCTV는 실시간 영상 확인뿐만 아니라 영상 저장, 녹화 및 녹화 중지 기능을 제공하며, 양방향 음성 기능을 통해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상하좌우로 카메라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 기능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만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 기반 어머니의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성 장애 자녀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참여 아동별 목표 과제에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 A는 인형 1개, 장난감 포크 1쌍, 클레이 그리고 컵이 사용되었다. 아동 B는 동사 카드와 그림책을 사용하였고, 아동 C는 장난감 자동차와 사람 모형 피규어 각각 1개씩과 그림책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zzano et al.(2022)의 부모 교수 기술 체크리스트(Parent Teaching Skill Checklist; PTSC)를 기반으로, 어머니가 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재 수행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변별 자극의 제시, 지시의 일관성, 적절한 후속 조치 등 개별시도교수의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중재 절차의 수행 정확도를 백분율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구의 문항 구조와 평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 대상 아동의 목표 과제 특성에 따라 예시 표현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개별시도교수이며, 종속변인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이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를 사용하였다(Cooper et al., 2007). 본 연구는 단일대상 연구로 기초선, 중재, 유지 및 일반화의 단계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약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024년 7월 첫째 주부터 7월 넷째 주까지 대상자 의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모집은 8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약 3주 간 이루어졌다. 모집 공고를 통해 어머니 지원자를 모집한 후 유선 면담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8월 넷째 주에 어머니 동의서를 받은 후, 9월 첫째 주부터 아동과 어머니의 기본 정보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관찰 및 평가를 텔레코칭 방식으로 총 4회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홈 CCTV를 설치하고, 아동과 어머니가 촬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총 2회의 적응 기간을 제공하였다. 적응이 완료된 후, 9월 셋째 주부터 아동의 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기초선 측정이 시작되었다.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 기반 개별시도교수 중재는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주 4회 총 8주 간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텔레코칭을 통해 자녀의 목표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중재 종료 후 11월 넷째 주까지는 유지 관찰을 통해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 3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치료실 일정 후 귀가한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LG U+의 ‘슈퍼맘카’ 홈 CCTV와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하였다(Lee & Paik, 2023). 실험은 아동의 방에서 진행되었고, 방 안에는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사용할 유아용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었다. 책상 위 스마트폰은 ZOOM 참여를 위해 거치대에 설치되었고, 홈 CCTV는 상호작용 관찰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 실험 과정을 녹화하였다. 녹화 영상은 피드백 제공과 행동 관찰 및 측정에 활용되었다.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개별시도교수 중재 실험 절차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 작성, 아동 사전 평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사전 훈련, 그리고 부모의 개별시도교수 직접 실행 중재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윤리적 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 후 서면 동의를 확보하였다. 이후, 아동의 언어 행동 발달 평가와 자극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여 각 아동의 목표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 대상 사전 훈련 단계에서는 행동기술훈련(Behavioral Skills Training; BST) 절차를 기반으로 이론 설명, 모델링, 리허설, 피드백을 포함한 부모 교육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직접 실행하는 중재 단계에서는 어머니가 텔레코칭을 통해 학습한 개별시도교수 기법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어머니의 중재 수행 정확도와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 변화를 평가하였다.
아동 사전 평가는 언어행동 발달 단계 평가(Verbal Behavior Milestones Assessment and Placement Program; VB-MAPP) (Sundberg, 2008)를 활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아동의 발달 수준과 중재가 필요한 핵심 영역을 파악하였다. 평가는 연구자가 어머니와 면담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중재 우선순위를 논의하였다. 평가는 청자반응, 동작모방, 음성모방, 인트라버벌의 언어행동 네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아동 A는 청자반응(2-M), 동작모방(1-M), 음성모방(0-M), 인트라버벌(0-M) 영역에서 모두 수준 1(0∼18개월)에 해당하는 낮은 성취를 보였다. 아동 B는 청자반응(10-M), 동작모방(10-M), 음성모방(10-M) 영역에서 수준 2(18∼30개월)에 해당하며, 아동 C는 청자반응(10-M), 동작모방(10-M), 음성모방(10-M), 인트라버벌(10-M)에서 모두 수준 2(18∼30개월)에 해당하였다. 평가 결과는 각 아동의 발달 수준과 중재가 필요한 목표 과제 설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Table 3>은 아동의 언어행동 발달단계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Notes. M (Milestone) indicates the number of developmental milestones reached in each verbal behavior domain according to the VB-MAPP Milestones Assessment. The VB-MAPP divides milestones into three levels based on typical developmental age: Level 1 (1-5M, 0-18 months); Level 2 (6-10M, 18-30 months); Level 3 (11-15M, 30-48 months).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의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선호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APA, 2013). 이러한 어려움은 학습 상황에서 아동이 원하는 강화물이나 자극을 정확히 제공받지 못하게 하여 동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선호도 평가는 아동의 선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강화물을 선택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annella, O’Reilly & Lancioni, 2005; Hagopian, Rooker & Zarcone, 2015; Lee & Paik, 2023; Piazza, Roane & Karste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호도 평가를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강화물을 식별하고 이를 중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Shawler et al.(2021)의 선호도 평가 절차를 참고하여 평가를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우선, 어머니에게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강화제 평가 설문지(Reinforcer Assessment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AISD)를 배포하여 아동이 선호하는 잠재적 강화물을 파악하였다(Fisher et al., 1996).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Fisher et al.(1992)의 연구에서 제시한 짝 자극 선택 선호도 평가(paired-choice stimulus preference assessment) 방식을 사용하여 아동의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텔레코칭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평가 절차를 안내하고 지시하였다. 어머니는 두 개의 자극을 아동에게 제시하며, 아동이 선호하는 자극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평가 절차만 수행하였으며, 촉구나 강화, 오류 수정 등의 개입은 하지 않았다. 선호도 평가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별 선호 자극과 강화물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각 아동의 선호에 맞춘 강화물을 선택하고 어머니가 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동 사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 아동의 발달적 강점과 약점, 그리고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도출된 요구를 종합하여 언어행동 과제를 설정하였다. 아동마다 발달적 수준과 중재 필요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스키너의 언어행동 이론에 근거한 기능적 언어 행동 유형 중 모방, 인트라버벌, 청자반응 영역(Cooper et al., 2007)을 선정하였다. 각 목표 과제는 자발적 반응 또는 지시 반응을 통해 초기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며, 중재 전후의 과제 수행률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아동 A는 상대방의 동작을 보고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초기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고 언어 습득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어머니가 사물을 활용하여 “엄마처럼 따라해”라고 말하면, 아동이 5초 이내에 촉구 없이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컵을 들고 마시는 동작을 시범 보일 때 아동이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거나, 포크로 클레이를 찍어 인형에게 먹이는 동작을 모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표는 사전 평가에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낮은 성취를 보인 아동 A의 초기 의사소통 기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아동 B는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맥락에 맞게 말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어머니가 의문사나 기능을 포함하여 질문하면, 아동이 5초 이내에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아플 때 누가 치료해줘?”라는 질문에 “의사”라고 답하거나, “칫솔로 뭐해?”라는 질문에 “양치해”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표는 사전 평가에서 인트라버벌 영역에서 제한적인 성취를 보인 아동 B의 맥락 이해와 대화 참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되었다.
아동 C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어머니가 위치 조사를 포함한 지시를 할 때, 아동이 5초 이내에 지시에 따라 정확히 반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피규어를 자동차 장난감 앞에 놓아라”라는 지시를 하면, 아동은 지시를 듣고 피규어를 자동차 장난감 앞에 놓거나, “침대 아래 있는 동물을 가리켜”라는 지시를 듣고, 침대 아래에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표는 사전 평가 결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생활연령에 비해 지연된 성취를 보인 아동 C의 청자 반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에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되었다. 각 아동의 목표 행동은 <Table 5>에 조작적 정의 및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어머니 대상 부모 훈련은 Azzano et al.(2022)의 텔레코칭 기반 부모 행동기술훈련 절차를 참고하여, 어머니에게 홈 CCTV와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활용한 텔레코칭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행동기술훈련의 첫 번째 단계인 교수 단계에서는 어머니에게 개별시도교수의 구성 요소와 수행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후, 비대면 화상회의(ZOOM)을 통해 개별시도교수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어머니들은 중재 기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절차를 학습하였으며, 연구자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각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와 이를 중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해당 단계에서는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질문은 제한되었다. 교수 종료와 함께 자료 화면 공유도 마무리되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시연한 개별시도교수 전략 비디오 영상을 어머니에게 제공하였다. 비디오는 다양한 반응 상황(정반응, 오반응, 강화 제공, 촉구 제공, 오류 수정 절차, 문제행동 관리 등)에 따른 교수 전략을 포함하였으며, 길이는 15초에서 1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 영상에서 연구자와 행동 분석 전문가가 각각 부모 역할과 아동 역할을 맡아 실제 상황을 시연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정확한 교수 절차, 촉구 제공 방식, 그리고 강화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였다.
리허설 단계에서는 아동의 목표 과제를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개별시도교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연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변별 자극 제시, 아동 반응 관찰, 정반응 시 즉시 강화, 오반응 시 오류 수정 절차, 필요 시 최소에서 최대의 촉구를 제공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실습하였다. 연구자는 간결하고 명료한 자극 전달 방법과 아동의 주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시도 간 간격(3∼5초)을 유지하며 다음 지시를 전달하도록 지도하였다. 오반응 또는 무반응이 나타날 경우, 어머니들은 오류 수정 절차를 통해 아동의 수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문제행동 관리에서는 행동의 기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아동이 목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개별시도교수의 다양한 자극 제시 방법인 집중 시도, 블록 로테이션, 랜덤 로테이션을 실습하였다. 집중 시도는 동일한 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특정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으로, 어머니들이 아동의 목표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블록 로테이션은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묶음 형태로 번갈아 제시하여 과제 간 차이를 변별하는 연습 방법으로, 아동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랜덤 로테이션은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무작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이 학습한 기술을 실제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용되었다. 이러한 실습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은 아동의 학습 수준에 따라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리허설 동안 연구자는 실시간으로 어머니들의 수행을 관찰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어머니들의 중재 수행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단계에서는 ZOOM을 통해 녹화된 어머니의 시연 영상을 보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피드백은 어머니가 올바르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칭찬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교정 피드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 방법과 교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예: 울기, 자리 이탈 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지도하였다. 연구자는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고, 아동이 과제에 다시 집중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개별시도교수 수행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연구자는 어머니가 개별시도교수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5회씩 2세트를 연습한 뒤, 수행 정확도가 80% 이상일 경우 이를 자녀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Table 6>은 텔레코칭 방식의 훈련 절차와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아동 A, B, C를 대상으로 기초선 관찰을 실시하였다. 기초선 측정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중재 전략도 제공하지 않았다. 기초선 관찰은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기초선 관찰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자녀의 목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초선 단계에서는 자녀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 여부와 반응이 관찰되었으며, 오반응이 발생하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촉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관찰된 반응을 기록지에 기록하였고, 모든 자료는 아동의 수행이 안정적으로 관찰될 때까지 수집되었다. 기초선 관찰은 아동의 수행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일 때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중재는 연구자가 어머니에게 실시간 텔레코칭을 통해 개별시도교수 절차를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직접 중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텔레코칭 기반 가정 내 중재는 2024년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주 4회, 회기당 약 1시간씩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에 따라 각 아동의 목표 과제를 개별적으로 훈련하였다. 중재 절차는 각 아동의 목표 과제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어머니들은 개별시도교수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수준과 학습 상황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였다.
아동 A의 첫 번째 목표과제는 어머니가 “엄마처럼 따라해”라는 지시에 따라 컵을 들고 마시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머니 A는 학습 시작 전에 아동의 주의를 확보하고, 교구와 강화물을 준비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되었으며, 필요 시 정해진 촉구 위계(최소 촉구에서 최대 촉구)를 따라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였다. 아동이 5초 이내에 정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칭찬과 함께 강화물을 제공하였으며, 오반응 또는 무반응 시에는 오류 수정 절차를 활용하여 정반응을 유도하였다. 어머니는 회기당 평균 10∼20회를 반복하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 나타나면, 두 번째 과제로 진행하였다. 아동 A의 두 번째 목표 과제는 어머니가 “엄마처럼 따라해”라는 지시에 따라 포크로 클레이를 찍어 인형에게 먹이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과제 시도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어머니 A는 아동의 주의를 확보한 뒤 지시를 내리고, 정반응 시 즉각 강화를 제공하였다. 각 시도 간에는 휴지기를 제공하여 아동이 과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에 도달하면, 첫 번째 목표 과제와 두 번째 목표 과제를 각각 3회의 시도로 구성된 세트(block)로 묶어 제시하였다. 이 때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 나타나면 중재를 종료하였다.
아동 B의 첫 번째 목표 과제는 어머니 B가 “아플 때 누가 치료해줘?”와 같은 의문사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어머니 B는 학습 시작 전에 아동의 주의를 확보하고, 교구와 강화물을 준비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필요 시 정해진 촉구 위계(변별하기-명명하기)에 따라 아동의 정반응을 유도하였다. 아동이 정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칭찬과 함께 강화물을 제공하였으며, 오반응 또는 무반응 시에는 오류 수정 절차를 통해 정반응을 유도하였다. 어머니는 회기당 평균 10∼20회를 반복하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 나타나면, 두 번째 목표 과제로 진행하였다.
아동 B의 두 번째 목표 과제는 “칫솔로 뭐해?”와 같은 사물의 기능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머니 B는 첫 번째 목표 과제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아동의 주의를 확보한 뒤 질문을 제시하고, 정반응 시 즉각 강화를 제공하였다. 각 시도 간에는 적절한 휴지기를 제공하여 아동이 과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에 도달하면, 첫 번째 목표 과제와 두 번째 목표 과제를 각각 3회의 시도로 구성된 세트(block)로 묶어 제시하였다. 이 때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 나타나면 중재를 종료하였다.
아동 C의 첫 번째 목표 과제는 어머니 C가 “자동차 앞(뒤)에 놓아”라는 지시를 제시하였을 때, 아동이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어머니 C는 학습 시작 전에 아동의 주의를 확보하고, 교구와 강화물을 준비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간단하고 명료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필요 시 정해진 촉구 위계(최소 촉구에서 최대 촉구)에 따라 아동의 정반응을 유도하였다. 아동이 정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칭찬과 함께 강화물을 제공하였으며, 오반응 또는 무반응 시에는 오류 수정 절차를 통해 정반응을 유도하였다. 어머니는 회기당 평균 10∼20회를 반복하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 나타나면, 두 번째 목표 과제로 진행하였다.
아동 C의 두 번째 목표 과제는 “자동차 위(옆)에 놓아”라는 지시를 제시하였을 때, 아동이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어머니 C는 첫 번째 목표 과제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아동의 주의를 확보한 뒤 지시를 제시하고, 정반응 시 즉각 강화를 제공하였다. 각 시도 간에는 적절한 휴지기를 제공하여 아동이 과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에 도달하면, 첫 번째 목표 과제와 두 번째 목표 과제를 각각 3회의 시도로 구성된 세트(block)로 묶어 제시하였다. 이때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3회기 연속 80% 이상 나타나면 중재를 종료하였다.
모든 중재 과정은 매 회기당 10∼30회를 반복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학습 속도와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었다. 연구자는 모든 회기를 녹화하여 어머니의 중재 수행 정확도와 아동의 과제 수행 결과를 체크리스트와 기록지에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중재 조건에서 아동이 언어행동 과제 수행 목표에 도달한 후 중재 종료 후에도 향상된 과제 수행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재 종료 1주 후 2024년 11월 둘째 주에 1회, 2주 후와 3주 후에 각각 1회씩 총 3회기를 실시하였다. 유지 조건은 중재 조건과 동일한 장소인 가정에서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을 관찰하였으며,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언어행동 과제 수행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기존에 학습한 언어행동 과제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일반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9월 넷째 주부터 2024년 11월 넷째 주까지 총 8주 동안 각 조건별로 약 25%에 해당하는 회기에서 일반화 단계를 실시하였다. 일반화 평가는 새로운 목표 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수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어머니가 개별시도교수를 수행하는 동안 아동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모든 절차는 기초선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어머니에게 추가적인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선, 중재, 유지, 일반화 단계의 모든 회기에서 어머니의 개별시도교수 중재 수행과 아동의 과제 수행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어머니 중재 수행 정확도 체크리스트와 아동 과제 수행 기록지에 각각 기록하였다.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대한 자료 처리는 각 회기에서 아동이 부모의 지시나 질문에 대해 5초 이내에 추가적인 촉구 없이 과제를 수행한 경우를 정반응으로 기록하였으며, 5초 이후에 반응하거나 지시에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거나 추가 촉구가 필요한 경우를 오반응으로 기록하였다. 정반응 횟수를 정반응과 오반응 횟수의 총합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 반면,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단서나 충분한 반응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도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유효한 반응을 다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개별시도교수 중재 수행 정확도는 각 시도마다 ‘실행’(+), ‘미실행’(-), ‘해당 없음’(NA)으로 기록되었으며, 수행 여부는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수행 정확도는 각 회기의 수행 항목 수를 전체 항목 수(10개)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선, 중재, 유지, 일반화 단계별 평균 수행도를 계산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장 경력 10년의 행동분석 전문가 1명을 제 2 관찰자로 선정하여 사전 관찰 기간 동안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제 2 관찰자가 관찰방법 및 목표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읽고 숙지한 후 사전 관찰 기간동안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연구자와 제 2 관찰자 간의 일치도가 90% 이상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찰자들은 연구의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하였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각 참여 아동의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를 포함하는 전체 실험 회기에서 각 실험 조건마다 무작위로 약 25%를 선정하여 두 관찰자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측정한 후, 다음의 공식에 의해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산출 방법은 총 시도 횟수를 일치된 시도 횟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99.7%(97.8∼100)로 나타났다.
중재 충실도는 연구자가 텔레코칭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중재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재 충실도 평가지 문항은 Azzano et al. (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 ‘해당 없음’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과정은 기초선, 중재, 유지, 일반화 조건에서 회기의 평균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비디오 녹화 영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의 중재 충실도는 실제 실행된 항목 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되었다. 그 결과, 연구자의 중재 충실도는 평균 98.8%(범위: 98.1%∼99.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구자가 텔레코칭 절차를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며, 텔레코칭의 효과성을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중재를 종료한 후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평가지 문항은 선행연구 Azzano et al.(2022), Hillman, Lerman, & Kosel(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목표행동 이해와 실행정도, 연구 절차, 중재 효과, 중재 만족도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와 연구 참여 어머니에게 설명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문항별 점수의 총합을 체크리스트의 전체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결과는 부모 참여자 A는 평균 5점, 부모 참여자 B는 평균 5점, 부모 참여자 C는 평균 5점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참여 어머니 3명이 각각의 자녀에게 중재를 실시하여 텔레코칭을 통한 어머니의 개별시도교수 중재와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과의 기능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텔레코칭을 통해 어머니가 직접 실행한 개별시도교수의 중재 수행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률에 대한 평균과 범위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초선 단계에 비해 중재 단계에서 모든 아동의 과제 수행률이 높아졌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높은 과제 수행률이 기록되었다.
아동 A의 경우, 기초선에서 평균 13.5%를 기록하였으며, 중재 단계에서는 평균 53.5%로 증가하였다. 유지 단계에서는 평균 100%를 기록하였다. 아동 B는 기초선에서 평균 27.7%, 중재 단계에서 평균 64.7%, 유지 단계에서 평균 71.5%의 수행률을 나타냈다. 아동 C는 기초선에서 평균 4.2%, 중재 단계에서 평균 70.6%, 유지 단계에서는 평균 99.9%를 기록하였다.
일반화 과제 수행에서 아동들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률에 대한 평균과 범위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아동 A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수행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동 B는 기초선에서 평균 9.3%, 중재 단계에서 평균 61.3%, 유지 단계에서 평균 63.4%를 기록하였다. 아동 C는 기초선에서 평균 2.7%, 중재 단계에서 평균 58.6%, 유지 단계에서 평균 80.1%를 기록하였다.
| Participant | Baseline | Intervention | Maintenance | |||
|---|---|---|---|---|---|---|
| Mean | (Range) | Mean | (Range) | Mean | (Range) | |
| A | 0 | (0) | 0 | (0) | 0 | (0) |
| B | 9.3 | (5.2-13.4) | 61.3 | (35.7-80.8) | 63.4 | (63.4) |
| C | 2.7 | (0-8.1) | 58.6 | (22.4-82.3) | 80.1 | (8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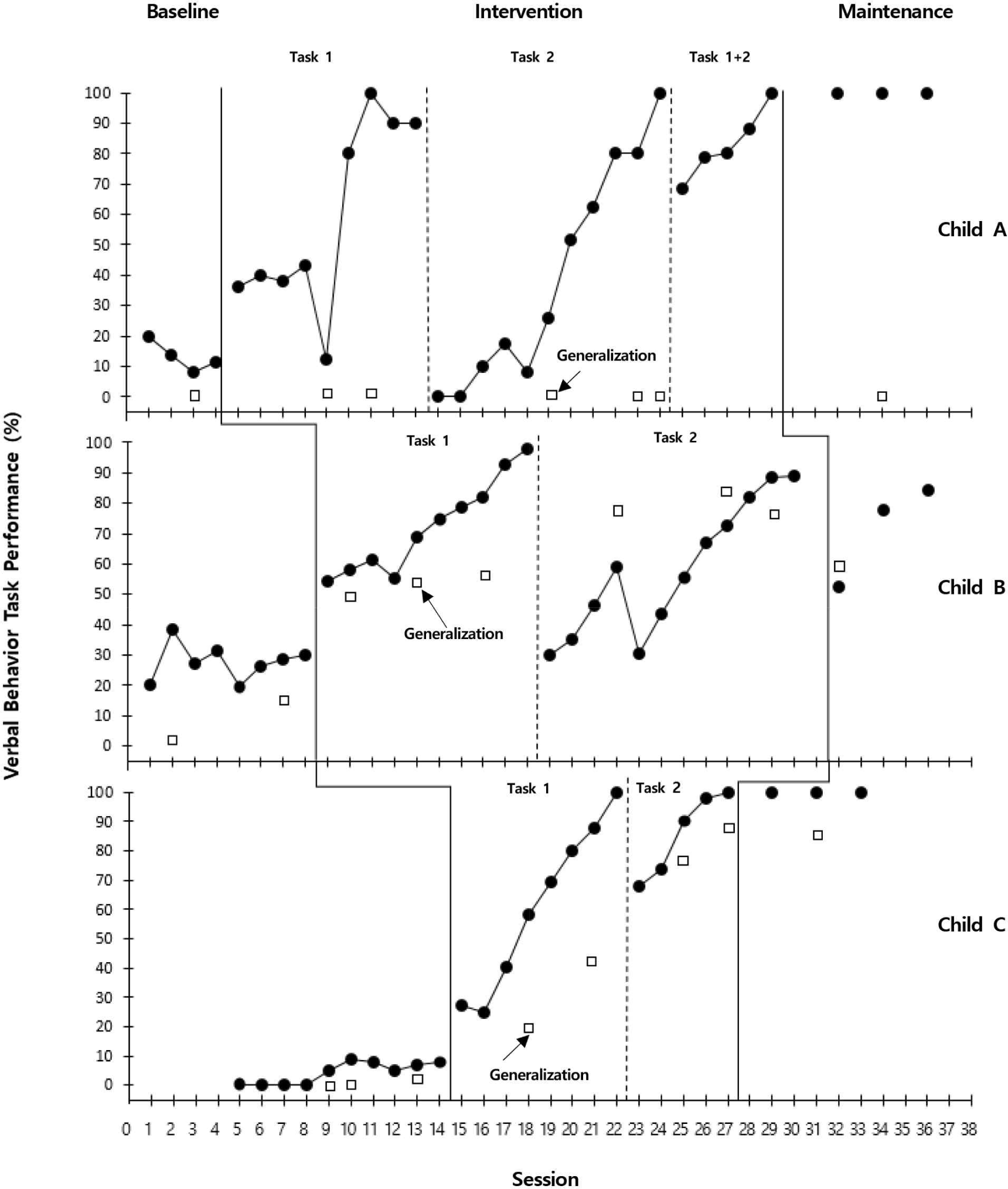
어머니의 중재 수행 정확도는 기초선에 비해 중재 단계에서 중재 수행 정확도가 높아졌다.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 A는 기초선에서 평균 17%, 중재 단계에서 평균 87.2%의 중재 수행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어머니 B는 기초선에서 평균 20.7%, 중재 단계에서 평균 94.7%의 중재 수행 정확도를 나타냈다. 어머니 C는 기초선에서 평균 22.5%, 중재 단계에서 평균 90.5%의 중재 수행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유지 단계에서는 중재 종료 후 1주, 2주, 3주 시점에서 기초선과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 1회씩 관찰을 실시하였다. 유지 단계 동안 어머니 A는 평균 100%, 어머니 B는 평균 99.7%, 어머니 C는 평균 100%의 중재 수행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의 중재 수행 정확도 평균 및 범위는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화 단계의 어머니의 개별시도교수 중재 수행 정확도 평균 및 범위를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A는 기초선에서 평균 4.8%, 중재 단계에서 평균 52.8%, 유지 단계에서 평균 50.2%를 기록하였다. 어머니 B는 기초선에서 평균 21.4%, 중재 단계에서 평균 88.9%, 유지 단계에서 평균 89.4%를 기록하였다. 어머니 C는 기초선에서 평균 12.2%, 중재 단계에서 평균 92.7%, 유지 단계에서 평균 100%를 기록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텔레코칭을 활용하여 어머니에게 개별시도교수 절차를 교육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수행한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가 텔레코칭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설계는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텔레코칭을 통해 어머니가 개별시도교수를 학습하고, 직접 자폐성 장애 자녀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을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아동은 기초선 단계에서 언어행동 과제 수행율이 평균 15.1%로 나타났으며, 중재 단계에서는 평균 62.9%로 증가하여 중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중재 종료 후 진행된 유지 단계에서도 언어행동 과제 수행률이 평균 90.5%로 나타났다. 이는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 기반 부모 교육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의 과제 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Ferguson, Dounavi & Craig, 2022; Lindgren et al., 2020; Meadan et al., 2014; Snodgrass et al., 2017; Ura et al., 2021)와 일치한다.
또한,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어머니의 개별시도교수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의 일반화에도 효과적이었다. 특히,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상황에서도 아동 B와 C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율은 기초선 단계에서 평균 4.0%, 중재 단계에서 평균 72.5%, 유지 단계에서 평균 80.3%로 큰 증가를 보였다. 이는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 기반 부모 교육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학습된 기술을 유지하도록 돕고, 새로운 행동의 습득과 일반화에도 기여함을 보여준 선행 연구 결과(Shingleton Smith et al., 2024; Ura et al., 2021; Vismara et al., 2013)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중재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된 기술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임상 환경 중심의 중재 연구(Crockett et al., 2007; Jung et al., 2015; Kim, 2024; Kim & Lee, 2020; Kim & Song, 2017; Lafasakis & Sturmey, 2007; Ward-Horner & Sturmey, 2008)와 차별화된다. 특히, 텔레코칭을 활용한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 변화가 자연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학습된 기술이 일상생활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Althoff et al., 2019; Graucher, 2022; Wetherby & Woods,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반화 단계에서 아동 A의 과제 수행률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 A가 일반화 조건에서 과제 회피 문제행동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이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목표 과제가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동기 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제 설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아동의 동기 설정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화 단계에서 아동의 과제 수행률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일반화 단계에서의 또 다른 제한점은 제한된 회기 수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일반화 회기를 확대하여 아동의 학습된 기술이 다양한 환경에서 유지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텔레코칭을 통해 학습한 개별시도교수 절차를 높은 정확도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들의 중재 수행 정확도는 기초선 단계에서 평균 20.1%에 불과했으나, 중재 단계에서 90.8%를 기록하였다. 중재 종료 후 측정한 유지 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중재 수행 정확도 평균은 99.9%로, 높은 수행 정확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텔레코칭이 부모의 중재 기술 학습과 수행 정확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Boutain, Sheldon & Sherman, 2020; Caron et al., 2022; Drew et al., 2023; Nefdt et al., 2010; Vismara et al., 2013; Wainer & Ingersoll, 2013)와 일치한다. 또한,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중재를 텔레코칭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중재 수행 기술을 효과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행 연구(Ferguson, Craig & Dounavi, 2019; Leyser et al., 2021; Neely et al., 2021; Schieltz et al., 2022; Schieltz & Wacker, 2020; Shingleton-Smith et al., 2024)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텔레코칭을 통해 어머니가 행동기술훈련 절차에 따라 개별시도교수를 학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높은 중재 수행 정확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Crockett et al., 2007; Lafasakis & Sturmey, 2007; Shin et al., 2021)와 일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홈 CCTV와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학습과 실행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료나 영상을 통해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던 선행연구(Choi et al., 2023; Choi et al., 2024; Lee, J. Y., & Lee, S. H., 2020; Nam & Lee, 2024; Yoon & Han, 2021)와 달리, 본 연구는 홈 CCTV와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부모가 중재를 수행하는 실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는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의 학습 상황에 맞춘 중재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실시간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부모가 문제행동 관리와 중재 수행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Crockett et al., 2007; Ward-Horner & Sturmey, 2008)과 차별화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문제행동 관리가 지침 수준에서만 제공되거나 실시간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본 연구는 부모가 문제행동 관리 전략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중재 수행 정확도의 측면에서 어머니 A는 일반화 단계에서 숙달 기준인 80%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 A 또한 동일 단계에서 낮은 과제 수행률을 보였고, 과제 회피 행동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가 낮을 경우 중재 효과가 감소하거나 문제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Arkoosh et al., 2007; Carroll et al., 2013; Pipkin, Vollmer & Sloman, 2010)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A의 낮은 중재 수행 정확도가 아동 A의 낮은 과제 수행률 및 일반화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Drew et al.(2023)은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가 자녀의 기술 습득 및 일반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와 아동의 행동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화 단계에서도 실시간 피드백과 추가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Fallon, Cathcart & Sanetti, 2020; Garbacz et al., 2014). 특히, 부모들이 학습한 개별시도교수 기술을 다양한 목표와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수 관찰 및 지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Lucyshyn et al., 2007).
본 연구는 텔레코칭을 활용하여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 향상과 부모의 중재 수행 정확도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부모는 텔레코칭을 통해 개별시도교수 절차를 학습하고, 이를 가정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언어행동 과제 수행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중재 효과는 중재 종료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학습된 기술은 새로운 과제로의 일반화가 이루어졌다. 전문가의 실시간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중재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Kim, 2024; Paik, 2020). 본 연구는 텔레코칭을 통해 부모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폐성 장애 아동과 가족이 보다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텔레코칭 중재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을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코칭 중재 과정에서 전문가가 부모를 훈련할 때, 오디오 및 비디오 지연, 영상 중단과 같은 기술적 문제는(Aranki et al., 2022; Gabellone et al., 2022),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여 중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를 통해 자폐성 장애 아동과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중재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