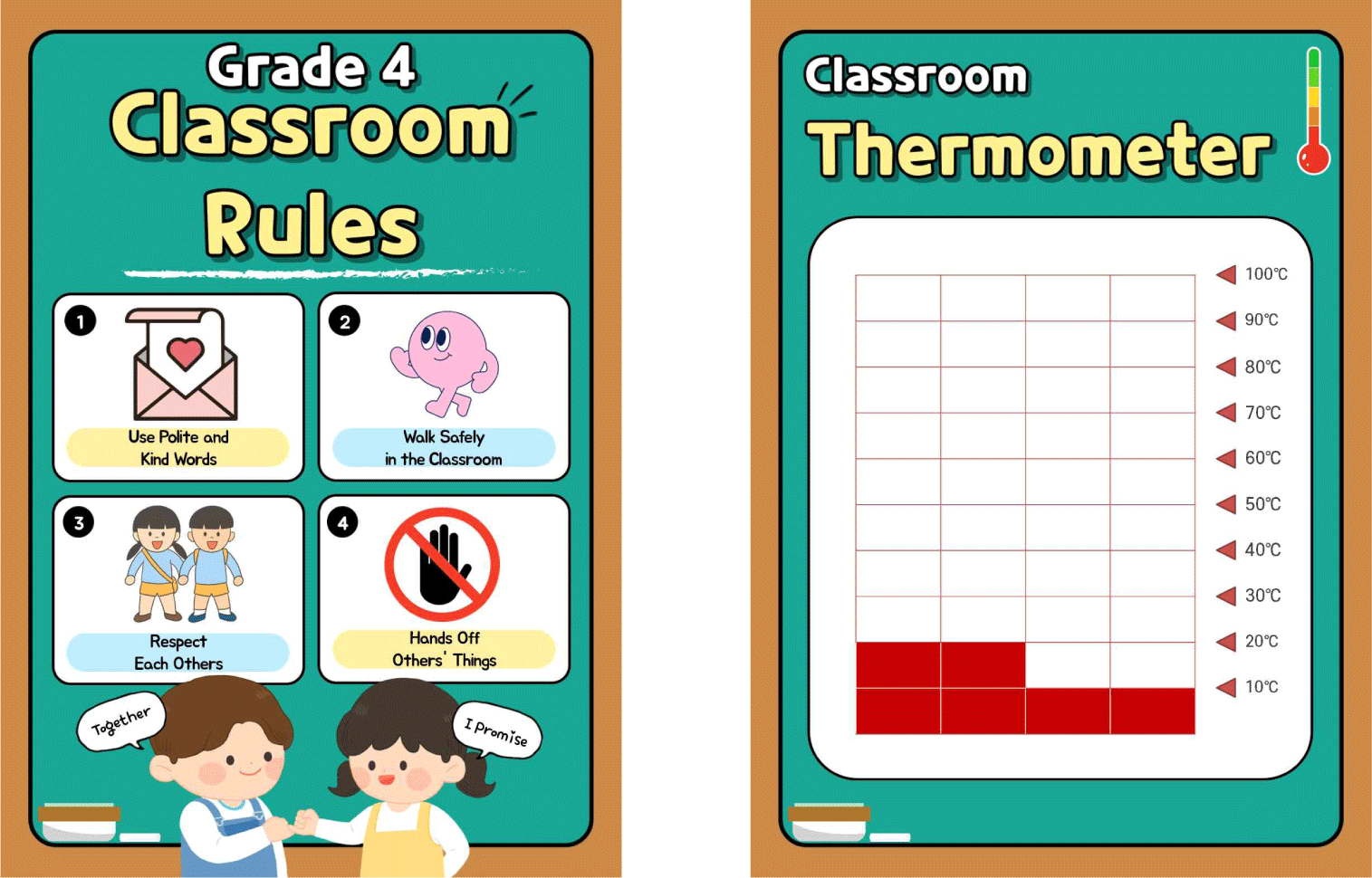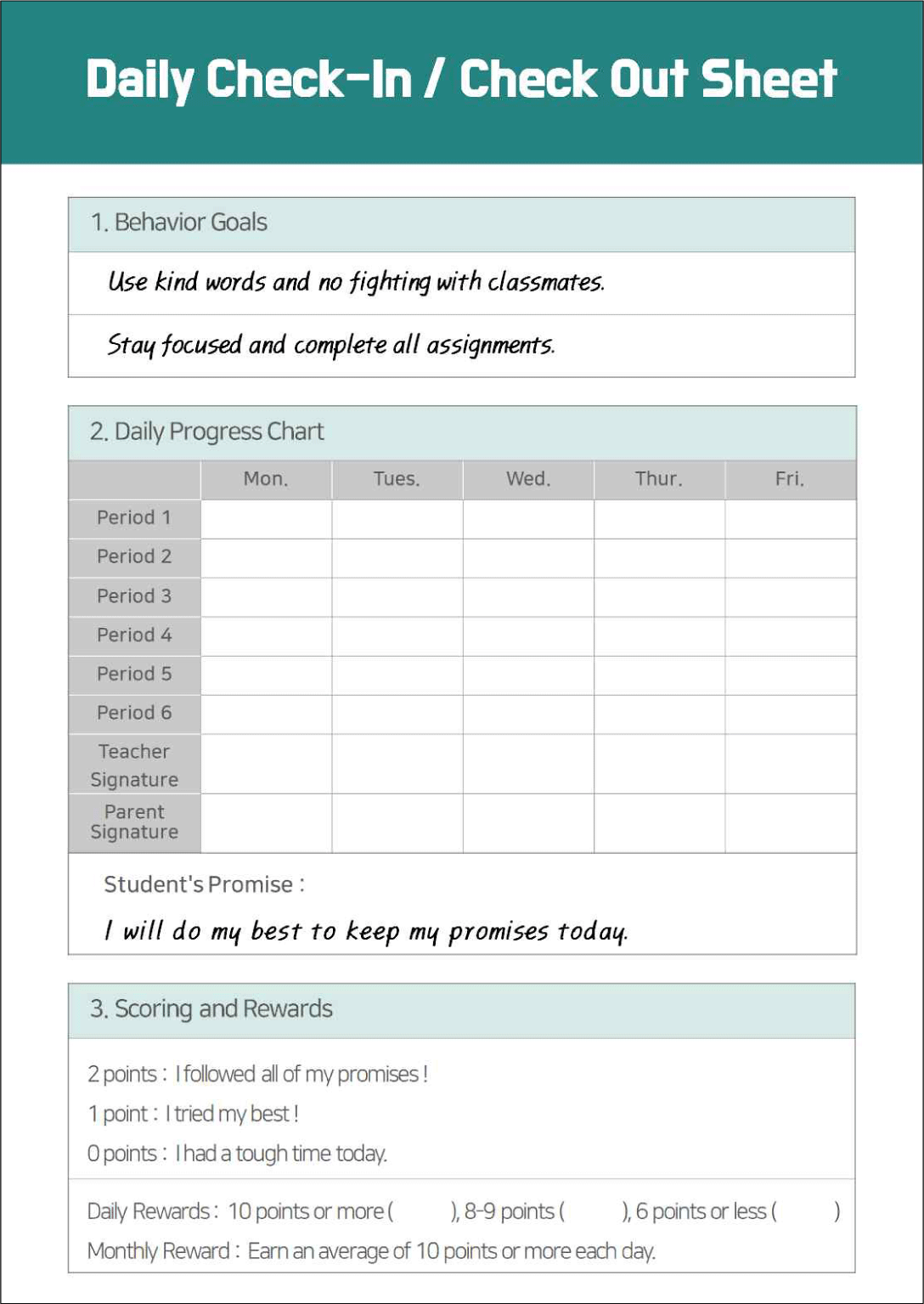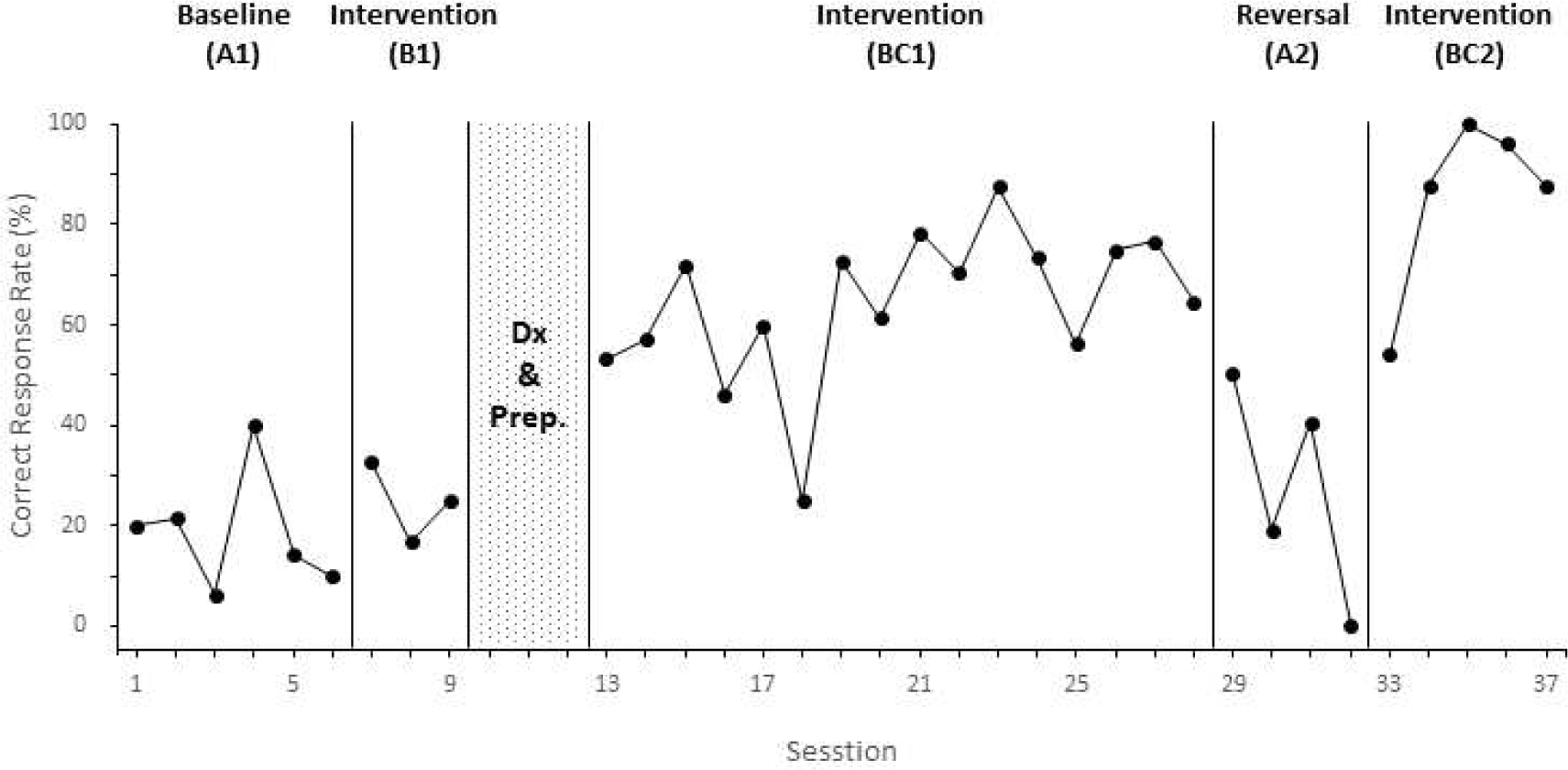I. 서론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 방안이 교육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은 학술적으로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student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으로 지칭된다. 즉, 불안, 위축, 신체 증상, 주의산만,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주요 특성으로 인해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은 학생들을 말한다(Caldarella et al., 2018; Jeong et al., 2024; Jung & Jung, 2015; Kern, Hilt, & Gresham, 2004; Lee & Hwang, 2019).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서·행동장애로 진단된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1.7%(1,831명)에 불과하였으나(Ministry of Education 2023a), 같은 해에 실시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2,641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Lim, 2025). 국외에서도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1% 수준으로 집계되지만(Wagner et al., 2005),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중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은 약 10-2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ash & Dozois, 2002). 이러한 차이는 공식적으로 진단된 정서·행동장애 학생보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이 장애로 진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강도가 낮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위험군 학생은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조기에 그 어려움을 발견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며, 누구보다 예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Murrietaa & Eklund, 2022; Reid et al., 2004). 그러나 국내의 기존 생활지도 방식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Park(2020)에 따르면, 교육부의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인 Wee 프로젝트는 예방 목적보다는 고위험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정책에 가깝고,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한 이후에도 정작 후속조치는 미흡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and Kang(2024)의 연구에서도 일반학교에서 시도했거나 운영하였던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은 학생들 간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학급을 세워가고 친절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심각한 위기행동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별화된 중재나 고강도 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2023년 9월「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포하였다. 이 고시를 근거로 교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 조치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b). 하지만 훈육의 방법으로 제시한 언어적·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 등은 이미 문제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처의 성격이 짙고, 훈육보다 가벼운 수준의 조치인 조언, 상담, 주의만으로는 심각한 행동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며, 긍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을 고려할 수 있다. PBS는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다층지원체계(multi-tiered system of support)이다.
우리나라의 PBS는 2000년대 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실천이 확산되었으며, 근래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적용 및 운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S 시 교육청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도에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사례에 참여한 교사들은 PBS가 기존 생활지도 방식에 비해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을 관찰하거나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학년 간 중재 전략이 연계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일회성 컨설팅보다는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주제는 학부모 협력이었다. 행동 중재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비협조적 태도로 참여하면 PBS를 운영하기가 어렵기에 학부모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Park & Kang, 2024).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면 PBS의 실행을 위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PBS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주체적인 참여는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Center on PBIS, 2025). Oh and Bang(2022)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가 PBS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PBS 실험 연구 중에서 학부모가 중재 과정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Kim, 2013; Park, Hwang, & Jang, 2012; Seo & Cho, 2021). 이 선행연구들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발달력과 평소 행동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능평가 과정에 협력하거나 가정에서도 자녀를 함께 지도하면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특수교육 환경에서 장애 유아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교육 환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중 일부의 사례는 학부모가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연구 수행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수동적인 역할로 참여하였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PBS 연구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보편적 교육 환경에 재학 중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반한 실천적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행동 변화를 이끌면서 학교와 가정 간의 의미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학교교육과정 전반에서 PBS의 공동 실행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학부모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에 대한 PBS의 중재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교육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한 PBS를 실행하고 중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교사와 부모 간 협력에 기반한 PBS를 통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이 실제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중재의 과정에서 학교와 가정이 보다 의미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일반학교의 초등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한 PBS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수행되었다. 이 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공립학교로 PBS는 4학년 1개 학급에서 운영되었다. 이 학급의 학생들은 매일 5교시 혹은 6교시까지 수업에 참여하며, 그중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에 해당하는 10세 남학생이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 선별 및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개별적인 행동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둘째, 학기 초, 약 한 달간 실행한 PBS 1단계 지원(보편적 지원)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학생, 셋째, 정서·행동장애 선별검사(NISE-K·EBS, ADHD-RS) 결과가 절단점(cut-off)을 초과한 학생, 넷째, 지능검사(K-WISC-Ⅴ 등) 결과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다섯째, 학부모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Note: NISE-K·EBS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Korean·Emotional and Behavioral Scale; Ryu et al., 2020), ADHD-RS (Attention Deficit/Hyper- 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DuPaul et al., 1998), K-WISC-Ⅴ(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 Fifth edition; Kwak & Jahng, 2019), NISE-K·ABS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Korean·Adaptive Behavior Scale; Ryu et al., 2018).
연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재를 실행하기 위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담임교사는 27년 경력의 초등교사로, 제1 연구자가 계획한 중재 전략을 직접 실행하고 학부모와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부모는 연구 참여 학생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 연구 참여 학생이 학교에서 중재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정에서도 행동 규칙을 점검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 연구자는 본 연구를 계획하고 설계하였으며,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담임교사에게 PBS의 실행 전반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하였다. 제1 연구자는 국제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BCBA, QBA)을 소지한 약 10년 경력의 특수교사로, 다년간의 PBS 운영 및 교직원 연수 경험, PBS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중재의 충실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재 충실도를 위해 월 2회 정기회의를 운영하였으며,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혹은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상시회의를 실시하였다. 제1 연구자는 회의를 통해 중재 전략에 관한 이론과 근거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담임교사는 자신이 배운 중재 전략과 절차를 시연해 보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제1 연구자는 중재에 필요한 자료와 교수 절차를 검토한 뒤 연구 참여 학생의 반응에 따라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 선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별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NISE-K·EB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척도 점수가 66T(백분위 점수 94.5)로 나타났는데, 이는 NISE-K·EBS 검사 요강에 따르면(Ryu et al., 2020) 예방적인 관심이 필요한 수준(60-64T)을 넘어 그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수준(65-69T)에 해당한다. 또한, 안정-일반-주의-심각 네 단계로 구분할 경우 주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특히, 외현화 척도 점수가 76T로 확인되면서 외현적인 문제행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ADHD-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점 26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교사용 절단점(cut-off)인 17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한편, 지적 기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K-WISC-Ⅴ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능지수(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FSIQ)가 98로 나타나면서 평균 범위의 지적 기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적응행동 수준을 살펴보고자 NISE-K·AB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적응행동은 표준점수 74로 나타났다. 이는 NISE-K·ABS 검사 요강에 따라(Ryu et al., 2018) ‘저조한 수준의 적응행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적 기술은 개념적 기술과 실제적 기술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 기능성이 정상 범위임에도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연구 참여 학생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이 보이는 수업방해행동과 수업미참여행동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기능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동기사정척도(motivating assessment scale, MAS; Durand, 1989)와 QABF(questions about behavior function; Matson, & Vollmer, 1995)를 사용하여 두 가지 문제행동에 대해 각각 간접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업방해행동은 주로 관심, 수업미참여행동은 주로 감각 기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음으로 직접관찰평가를 수행하였다. 직접관찰평가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업 관련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수업 종료 직후 A-B-C 기록지(antecedent-behavior-consequence)를 작성하고, 제1 연구자가 A-B-C 기록지를 확인하면서 행동의 유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수업방해행동의 기능이 관심이고, 수업미참여행동의 기능은 감각임을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음악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가 학급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함께 노래 부르는 활동을 제시했을 때, 연구 참여 학생은 과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드는 과잉행동을 보이면서 수업을 중단시켰다. 학급 친구들은 웃음으로 반응했고,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장난치지 말라며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으나 그 또한 오히려 학생에게 관심 기능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행사건, 문제행동, 후속결과 등을 종합하면 수업방해행동은 또래나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예로는, 사회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학습지를 제시하는 상황이 있었다. 연구 참여 학생은 수업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종이를 구기거나 찢는 행동만 반복하였다. 그러한 행동은 또래나 교사의 관심이나 자극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담임교사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여, 연구 참여 학생이 평소에도 종이를 찢거나 가위로 오릴 때 느낄 수 있는 소리나 느낌을 선호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수업미참여 행동은 사회적 관심이나 과제의 유무와는 무관하며, 자극 자체에 대한 감각적 만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업방해행동은 관심 얻기 기능에 의해, 수업미참여행동은 감각 추구 기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파악한 기능을 중재 전략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행동은 수업참여행동이다. 이는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거나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반대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만지는 행동 등은 수업참여행동의 비발생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학습용 도구(예: 가위)를 사용하더라도 수업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비발생으로 간주하였다.
수업참여행동을 목표행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일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 중재의 효과보다는 문제행동을 나타낸 학생이나 문제행동 그 자체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칫하면 문제행동을 모방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행동 중재에 집중하게 될 경우, 또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문제행동 감소보다는 바람직한 행동 즉, 기대행동을 증가시키는 접근이 보다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업참여행동을 목표행동으로 설정하였다.
수업참여행동의 조작적 정의와 정반응 및 오반응의 예시는 <Table 3>과 같다.
수업참여행동 발생 자료는 순간시간표집법(momentary time sampling)을 통해 수집되었다. 제1 연구자는 중재자에게 주 3회, 오전 수업 시간 중 한 교시 동안 수업의 전체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였다(예: 월요일 3교시, 화요일 2교시, 수요일 4교시). 촬영을 진행하는 시간은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 시간이면서 유사한 성격의 교과의 수업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체육 교과나 음악 교과와 같이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시간이나 수업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 교과 시간은 촬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촬영된 약 40분 분량의 동영상을 1분 간격씩 총 40개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업참여행동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O’(발생) 또는 ‘X’(비발생)로 기록하였으며, 발생 간격의 수를 전체 간격의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다만, 회기별로 전체 간격의 수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학급의 또래 학생들이 연구 참여 학생의 앞을 지나가거나, 연구 참여 학생이 수업 활동 중에 잠시 자리를 옮기는 등 학생의 행동이 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전체 간격 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수업을 진행한 담임교사와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을 분석한 제1 연구자의 교차 검토하에 수업참여행동 발생률 데이터로 최종 확정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자 간 일치도(interobserver agreement, IOA)를 측정하였다. IOA 평가에는 담임교사가 주 관찰자로, 제1 연구자가 보조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다만, 담임교사는 관찰 및 측정 경험이 부족한 일반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IOA 평가 전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찰자 훈련은 연구 계획 단계에서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했던 수업 영상을 활용하여 주 관찰자와 보조 관찰자가 각각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을 산출한 후 서로의 기록을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수업참여행동 발생 여부가 상이했던 구간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측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지를 너무 빨리 작성하거나 오답을 말하는 행동은 수업참여행동 발생으로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습지에 낙서를 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수업 관련 질문이지만 내용이 언어유희(말장난)인 경우에는 수업참여행동 비발생으로 기록하엿다. 주 관찰자와 보조 관찰자의 측정 기록이 80% 이상 일치할 때까지 관찰자 훈련을 반복한 뒤 IOA 평가를 실시하였다. IOA 평가는 기초선 단계(A1, A2)와 중재 단계(B1, BC1, BC2)에서 각각 30%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Kang, Min, & Son, 2024). 그 결과, 기초선 단계에서의 IOA는 평균 88.3%(81.2-93.7%)였으며, 중재 단계에서의 IOA는 평균 91.1%(85.0-97.5%)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IOA는 90.3%(81.2-97.5%)였다. 일반적으로 IOA의 수용 가능한 수준은 80% 이상이므로(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014; Cooper, Heron, & Heward, 2020), 본 연구에서 수집한 실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IOA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 Phase | Number of Sessions | IOA Mean (%) | IOA Range (%) |
|---|---|---|---|
| Baseline (A1, A2) | 3 | 88.3 | 81.2–93.7 |
| Intervention (B1, BC1, BC2) | 7 | 91.1 | 85.0–97.5 |
| Overall | 10 | 90.3 | 81.2–97.5 |
본 연구는 반전설계를 변형한 중다중재설계(multitreatment design)를 적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반전설계는 단일대상연구에서 인과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설계로 알려져 있으나 종속변인이 반전 가능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Cooper et al, 2020). 다시 말해,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의 경우 반전설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은 수업 참여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과 언어 이해 능력은 갖추고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수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반전이 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험은 총 여섯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순서대로 기초선 단계(A1), 중재 단계(B1), 문제 진단 및 준비 단계, 수정된 중재 단계(BC1), 반전 단계(A2), 수정된 중재 단계(BC2)로 진행되었다. 연구 초기 계획했던 반전설계는 중재의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B1), 반전 단계(A2)와 중재 단계(B2)를 거쳐 기능적 관계를 반복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재 단계(B1)에서 중재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함에 못함에 따라, 제1 연구자는 중재를 잠시 중단하고 효과가 부족한 원인을 진단하고 중재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 이후 적용한 수정된 중재는 이전 중재와 완전히 다른 중재(C)라기보다는 기존 중재를 확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계의 명칭을 BC로 명명하였다(Yang, 2015). 이러한 연구 설계는 중재와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중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되었다. 학기 초인 2-3월에는 연구 참여 학생의 배경 정보와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한 뒤, 중재 전략 및 실험 절차를 설계하였다. 이후 4월부터 7월까지 총 34회기에 걸쳐 기초선 단계(A1), 중재 단계(B), 문제 진단 및 준비 단계, 수정된 중재 단계(BC1), 반전 단계(A2), 수정된 중재 단계(BC2)의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절차와 그에 따른 연구 기간은 <Table 5>와 같다.
실험 전 단계에서 연구 참여 학생의 담임교사는 PBS를 운영하기 위한 협력적 팀을 구성하였다. PBS 팀은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 학부모, 그리고 국제행동분석문가(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BCBA)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팀 구성원들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특성과 그에 따른 중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 학생이 수업 중에 보이는 문제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능평가를 실시하였고,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된 중재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또한, 실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여 회신받았다. 이외에도 팀 구성원들은 중재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측정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였다. 학교장과 교감은 연구 수행을 위해 행정적인 검토와 사항을 검토하고 PBS 실행을 지원하였다. 담임교사는 연구의 중재자로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중재를 직접 실행하였고, 학부모는 가정 내에서 중재를 실행하며 중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CBA는 중재 전략을 계획하고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중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응용행동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하였다.
PBS 팀 구성원과 역할은 <Table 6>과 같다.
기초선 단계(A1)에서는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운영하였다. 보편적 지원은 학급의 담임교사가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약 10분간 진행되는 ‘아침 열기’ 시간을 활용하여, 기대행동을 안내하고 교수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아침 열기는 다 함께 인사하기부터 시작되며 이어서 행동 규칙 확인하기, 교과서 가져오기, 짧은 글쓰기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주간학습안내’라는 서면 지침을 제공하여 한 주의 시간표와 교과별 학습목표를 설명하고 수업 중에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강조하였다. 담임교사가 중점적으로 지도한 행동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2) 교실 내에서 안전하게 걷기, (3) 서로를 존중하기, (4)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않기. 이러한 규칙은 학기 초 학급자치 시간에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교실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규칙이었다. 이에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의 일과 중에 학급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틈틈이 행동 규칙을 상기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학급 규칙 교수 및 강화 자료는 <Figure 1>과 같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매일 하교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면서 행동 규칙을 잘 지켰는지 회상해 보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행동 규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 경우 손을 들어 응답하였다. 네 가지 행동 규칙에 대해 각각 16명 이상(재학생 22명 중 2/3 이상)이 손을 든 경우, 학급 온도계를 한 칸 채우는 방식으로 집단강화를 제공하였다. 행동 규칙이 네 개였기 때문에, 하루 최대 네 칸까지 학급 온도계를 올릴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급 전체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보편적 지원을 실행하면서 3월부터 영상 촬영 및 관찰을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실험의 A1은 4월 8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3주간 총 6회기에 걸쳐 실행되었다.
첫 번째 중재 단계(B1)에서는 보편적 지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 개인을 위한 개별화된 행동 중재를 추가로 실행하였다. 먼저,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열기 시간에 행동 규칙을 교수하고 집단강화를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은 매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다음으로 개별화된 행동 중재는 체크인-체크아웃(Check-In/Check-Out, CICO) 양식을 활용한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통해 기능기반의 중재 전략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CICO는 일반적으로 PBS의 Tier 2에서 활용되는 전략이며, Tier 1을 운영하는 교사가 CICO를 함께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 교실 내에서의 수업참여행동이 목표행동이고, 2) 외부 인력을 투입하기보다 최대한 학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재를 우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보편적 지원과 개별화된 행동 중재를 함께 실행하도록 하였다. 개별화된 행동 중재는 연구 참여 학생 한 명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되었고, 등교 이후 시점부터 하교 시점까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는 <Figure 2>와 같다.
특히,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 중 문제행동의 기능이 관심 얻기와 감각 추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개별화된 행동 중재를 운영할 때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부족하고 교사나 또래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돌발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그와 동시에 감각적 자극을 얻기 위해 수업과 무관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운영하며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 얻기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수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주어 감각 추구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무료한 상황을 예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에 과도한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수업 활동에서 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학교의 일과 중에 개별화된 행동 중재를 실행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는 연구 참여 학생이 등교하면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제시하고 하루 동안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교수한다. 행동 규칙은 연구에서 설정한 수업참여행동을 담임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시하되, 연구 참여 학생이 직접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 상단에 작성한다. 둘째, 연구 참여 학생은 매 수업 시간이 마칠 때마다 그 시간에 자신이 행동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0점(미이행), 1점(노력함), 2점(이행함) 중 하나로 기록한다. 셋째, 담임교사와 연구 참여 학생은 하교 전, 함께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확인한다. 이때 학생에게 하루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고, 기록된 내용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담임교사가 서명란에 서명한다. 넷째, 연구 참여 학생은 귀가 후, 가정에서 학부모에게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보여주면서 학교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간략히 공유한다. 학부모는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정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뒤 학부모 서명란에 서명한다. 즉, 학부모가 단순히 학교에서의 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의 연속성을 높이고 연구 참여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학부모가 서명하지 못한 날이 발생하더라도 연구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온 경우 담임교사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중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담임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일관된 관심과 지지를 전달하였다. B1은 5월 13일(월)부터 5월 22일(수)까지 2주간 3회기에 걸쳐 실행되었다. 다만, B1의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 참여 방안을 포함하여 중재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1을 실시하면서 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을 측정하였으나 세 번의 회기 동안 중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교실에서 관찰된 연구 참여 학생의 태도도 B1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에 대한 동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제1 연구자와 담임교사는 중재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 및 보호자 면담, 관찰, 회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재의 효과가 미흡하였던 원인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이 확인되었다. 첫째, PBS 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학부모가 부재한 날이 많았다. B1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였으나, 아버지의 업무 특성상 잦은 출장과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실제로 중재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날이 일부 있었으나, 그 경우에도 학생에게 주로 부적 강화를 제공하여 동기설정조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를 사용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특정한 선호물 그 자체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보상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느낄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과 교사나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소일 것이다. 즉, 부적 강화보다는 정적 강화와 사회적 강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버지는 대부분 부적 강화(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면제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와 가정 간에 일관성이 갖춰지지 않아서 학교에서의 강화제 효과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용돈을 많이 주었고, 학생이 선호하는 고가의 장난감(예: 프라모델)을 자주 사주었다. 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강화제의 효과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BS 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였으며, 가정에서의 부적 강화나 과도한 선물은 지양하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학교에서 사회적 강화 중심의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보완하였으며, 강화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학교와 가정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였다. 문제 진단 및 준비 단계는 5월 27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총 3주간 진행되었다.
두 번째 중재 단계(BC1)에서는 B1에서 활용했던 개별화된 행동 중재 전략을 보완하여 수정된 형태로 적용하였다. 특히, 담임교사 주도로 중재를 운영하였던 B1과 달리, BC1에서는 학부모가 중재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에는 아버지가 일일점검카드에 간헐적으로 서명하는 수동적인 확인자 수준의 참여에 머물렀다면, BC1에서는 어머니가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 참여를 확인하고 가정에서 동일한 기준과 강화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재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의 학부모 서명란 아래에 ‘학부모 의견 기입란’을 추가하여 양방향의 정보 공유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어머니는 PBS 회의에 참여하였고, 자녀의 취침 시간(오후 10시)을 정해서 교육하였으며, 약물 복용 정보를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재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관찰한 학생의 행동 양상이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교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담임교사가 연구 참여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재의 공동 실행 주체로 역할하였으며, 실제로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 학생은 어머니의 일관된 피드백과 격려를 통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BC1는 6월 17일(월)부터 7월 9일(화)까지 4주간 총 16회기 실시되었다.
기존 중재 단계(B1)와 수정된 중재 단계(BC1)의 주요 차이점은 <Table 7>과 같다.
반전 단계(A2)에서는 A1과 동일하게 학급 단위의 보편적 지원만을 실행하였고 개별화된 행동 중재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는 중재의 철회에 따라 수업참여행동이 감소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반전설계는 중재와 목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실험 설계로 알려져 있으며(Cooper, Heron, & Heward, 2020),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통해 수업참여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중재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전 단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A2의 종료 기준을 ‘BC1의 평균 수업참여행동 발생률보다 30% 이상 낮은 값이 3회 이상 연속적으로 관찰될 경우’로 설정하였다. A2는 7월 16일(수) 도입하여 종료 기준을 충족한 7월 18일(수)까지 총 3회기 실행하였다.
세 번째 중재 단계(BC2)에서는 BC1에서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중재 전략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BC1과 동일한 학급 단위의 보편적 지원과 함께 개별화된 행동 중재를 병행하였으며, 중재 충실도 확보와 수업참여행동의 안정적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BC1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 단계는 A2에서 중재를 철회한 뒤 수업참여행동이 감소했던 결과가 외부의 다른 요인의 영향이 아니라, 중재의 철회에 따른 기능적 관계임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동일 중재가 시점이 달라졌을 때에도 일관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 중재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BC2는 7월 22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일주일 동안 총 5회기 동안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가 계획된 대로 일관되게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 충실도(implementation fidelity)를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 평가는 행동분석가 3인과 특수교사 1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총 34회기 동안 진행된 실험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10회기의 중재 영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중재 충실도 평가는 ‘중재 계획’과 ‘중재 실행’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되었다. 체크리스트는 Kang et al.(202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목표행동의 조작적 정의, 기능평가의 적절성, 중재 절차의 실행 여부, 강화 전략 사용, 기록 및 피드백 제공 등 구체적인 중재 수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중재 충실도의 평균 점수는 4.33점(총점 환산 기준 86.5점)으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인 80점을 상회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행동 정의와 중재 절차의 일관성, 중재 기간의 적절성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강화제의 효과성과중재자의 중립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기록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시각적 분석은 단일대상연구에서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다(Hong, 2009; Yang, 2015). 본 연구에서는 수준(level), 변화율(variability), 효과의 즉각성 정도(immediacy of effect), 그리고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ND) 등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수업참여행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Kang & Oh, 2025). 첫째, 수준은 단계 내 자료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지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A1, B1, BC1, A2, BC2)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의 합을 총 자료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변화율은 단계 내 자료가 퍼져 있는 범위, 즉 안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 내에서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확인하여 제시함으로써 자료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셋째, 효과의 즉각성 정도는 중재가 적용된 직후 얼마나 빠르게 행동이 변화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의 마지막 자료점과 다음 단계의 첫 자료점 간의 차이 즉, 수직적 거리를 계산하여 효과의 즉각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PND은 중재 단계의 자료가 기초선 단계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초과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단계의 자료 중 기초선 단계의 최고값을 초과한 자료점의 수를 중재 단계의 전체 회기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PND를 산출하였으며, Tarlow and Penland(2016)의 방식을 참고하여 유의확률(p-value)을 산출하였다. PND 값은 일반적으로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높은 효과 크기로 간주되며, 70-90%는 중간 효과 크기, 50-70%는 낮은 효과 크기로 해석되며, 50% 미만으로 나타나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Scruggs, Mastropieri, Cook, & Escobar, 1986).
본 연구가 학생과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의미 있고 수용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타당도를 검토하였다(Marchant, Heath, & Miramontes, 2013). 사회적 타당도 평가는 중재 충실도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동일한 행동분석가 3인과 특수교사 1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평가자들은 제1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실험 설계, 중재 절차 및 주요 장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 영상을 간략히 시청한 후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를 위해 목표 중요성, 절차 수용성, 결과 의미성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Kang, Kim, & Cho(202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평가자들이 각 문항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과, 본 연구의 사회적 타당도는 평균 4.25점(환산점수 85.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업참여행동을 목표행동으로 설정한 점과,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중재를 적용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실험을 수행한 학교의 1학기 학사일정이 종료되어 유지 단계를 도입하지 못하였는데, 이 때문에 변화된 행동의 유지에 관한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일반학교 초등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실행한 긍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남학생 1명이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전설계를 변형한 중다중재설계(multitreatment design)를 적용하였다. 본 실험은 기초선 단계(A1), 중재 단계(B1), 문제 진단 및 준비 단계, 수정된 중재 단계(BC21), 반전 단계(A2), 그리고 수정된 중재 단계(BC2)까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발생률 데이터를 수준, 변화율, 효과의 즉각성 정도, PND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기초선 단계(A1)에서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의 평균 발생률은 18.7%(6.3-40.0)%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 단계에서 학생은 대부분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혼자 딴짓하거나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간혹 수업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지속성이 부족했다. 이후 제1 중재 단계(B1)에서 교사와 학부모(아버지)가 협력하여 PBS의 개별화된 행동 중재 전략을 적용하였으나, 수업참여행동의 평균 발생률은 24.7%(16.7-32.5%)로 나타났다. 이는 A1에 비해 약 6.0%p 소폭 증가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부 회기에서는 A1보다 낮은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교실 현장에서도 수업참여행동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B1의 효과 크기를 산출한 PND 값도 0%로 나타나면서 중재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중재의 효과가 제한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중재 전략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진단 및 준비 기간을 운영하였다. 물론, 단 3회기만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동 중재를 진행하면서 학생의 변화를 기다려 볼 수도 있었으나, 학교 현장은 실험 자체가 목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최선의 실제만을 제공해야 하므로 진단 및 준비 기간을 가졌다.
이후 중재 단계(BC1)에서는 수정된 중재 전략을 실행하였으며, 이 시점부터 수업참여행동의 발생률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BC1에서 연구 참여 학생의 평균 수업참여행동은 64.3%(25.0-87.5%)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A1에 비해 약 3배 이상 향상된 결과였다. 또한, A1의 마지막 자료값과 BC1의 첫 번째 자료값 간 수직적 거리를 산출하여 살펴본 효과의 즉각성 정도가 42.9%p로 나타나면서, 중재 도입 직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8회기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감기 기운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이후 회기부터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BC1의 PND 값은 93.8%로 높은 효과 크기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도 .0001로 나타나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중재와 목표행동 간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재를 철회한 반전 단계(A2)에서 수업참여행동의 평균 발생률은 감소하였다. A2의 평균 수업참여행동은 32.7%(0.0-53.8%)로 나타났으며, 이는 BC1에 비해 1/2 정도로 감소한 수치이며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중재를 다시 적용한 BC2 단계에서는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이 평균 92.9%(87.5-100.0%)로 증가하여 실험의 기능적 관계가 입증되었다. A2의 마지막 자료와 BC2의 첫 번째 자료의 수직적 거리를 통해 살펴본 효과의 즉각성은 53.8%p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중재가 학생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었음을 시사한다. BC2의 PND 값 역시 100%로, 높은 크기의 중재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그래프상에서 35회기부터 37회기까지의 세 회기 동안 수업참여행동의 평균 발생률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감소폭은 초등학생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집중력의 차이로 해석되었다.
수업참여행동 발생률 데이터의 변화는 <Figure 3>과 같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학교 초등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실행한 긍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남학생 1명이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전설계를 변형한 중다중재설계(multitreatment design)를 적용하였다. 본 실험은 기초선 단계(A1), 중재 단계(B1), 문제 진단 및 준비 단계, 수정된 중재 단계(BC21), 반전 단계(A2), 그리고 수정된 중재 단계(BC2)까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발생률 데이터를 수준, 변화율, 효과의 즉각성 정도, PND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한 PBS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선 단계(A1)에서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의 발생률은 평균 18.7%(6.3-40.0%)로 매우 낮았으며, 학부모의 참여가 표면적인 수준에서 그쳤던 첫 번째 중재 단계(B1)에서도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은 평균 24.7(16.7-32.5)%로 여전히 저조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재 절차를 보완한 두 번째 중재 단계(BC1)에서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은 평균 64.3%(25.0-87.5%)로 상승했다. 또한, 반전 단계(A2)에 이어서 실시했던 세 번째 중재 단계(BC2)에서 연구 참여 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발생률은 평균 92.9%(87.5-100%)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행동 중재를 실행할 때 학생이 수업 활동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중재가 중요하며, 실천적 차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 협력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PBS를 실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는 면이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PBS 실험연구를 분석한 문헌연구들을 살펴보면, PBS의 연구 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많고(Kim, Choi, & Yun, 2023), 발달장애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Lee & Baek, 2024), 중재 수준은 개별 차원인 경우가 많았다(Park & Song, 2023). 본 연구에서도 학급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선별하여 개별화된 행동 중재 전략을 실행한 뒤 중재 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반복 입증하는 결과이자, 보편적 지원 수준에서 적절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개별화된 중재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장애 학생이 아니라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 즉 비장애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PBS가 장애 학생을 비롯하여 특정 대상에게 한정된 접근이 아니며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임을 확인한다. 앞으로도 PBS는 특수교육만의 접근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일반학교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중재를 실행한 점에서 학교-가정 연계의 실천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PBS는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일상적인 수업 및 가정 생활 속에서 중재를 실행하였다. 특히, 담임교사가 직접 중재를 설계하고 실행하였으며, 학부모가 중재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자로 기능하였던 점은, 향후 PBS의 교내 실행 가능성을 확대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동을 지도함으로써 학생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단순한 가정통신문이나 일회성 상담을 넘어서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 기반 협력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문제행동의 감소보다 수업참여행동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의 PBS 연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데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Choi & Kim, 2018; Kang, Kang, & Son, 2021; Kim, Jeon, & Lim, 2014; Kim & Paik, 2016; Kim & Park, 2014; Kwon, Kim, & Yun, 2023; Yoo & Lee, 2016)에서는 수업참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을 목표행동으로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PBS가 교과 학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PBS의 궁극적인 목표에 학업 성취(academic achievement)가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수업참여행동을 증진시키고자 학부모가 중재자로 참여했던 점도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장애 학생의 보호자가 참여했던 PBS 논문을 분석한 연구(Oh & Bang, 2022)에 따르면, 보호자는 주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PBS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부모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능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효과가 미미했던 중재를 개선하기 위한 진단과 수정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부모의 참여로 중재의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학생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PBS는 부모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Brookman-Frazee & Koegel, 2004), 확인자나 동의자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주요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중재에 관심이 있는 일반학교 교사들에게 실행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서 PBS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PBS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접근으로 인식되어 현장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아침열기 활동과 접목하여 PBS의 보편적 지원을 자연스럽게 실행하였다. 특히, 체크인-체크아웃 방식의 행동 약속 일일점검카드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연구 참여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중재 도구로 사용된 일일점검카드 역시, 교사와 학부모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간단한 언어적 지도와 비언어적 피드백으로 중재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PBS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PBS를 적용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단일대상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록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에게서 뚜렷한 행동 변화가 확인되었지만, 동일한 중재가 다른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에게도 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특성을 지닌 학생으로 연구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Horner et al., 2005) 특히,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을 선정할 때,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그러나 정서·행동상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성적이고 위축된 행동,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Kern et al., 2004), 후속연구에서는 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중재 단계(BC2)를 마친 이후, 학교의 1학기 학사일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행동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변화된 행동의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수업참여행동의 증가가 학업 성취에 어떠한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행동과 학업은 별개가 아니므로(McIntosh & Goodman, 2016), 수업참여행동이 변화함에 따라 학업적인 성취도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재(BC1, BC2)와 목표행동 간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반전 단계(A2)를 설정하였으나, 취약한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연규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한이 있다. A2는 중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학생의 행동 변화 여부를 관찰하는 단계로, 반전설계에서는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바람직한 학생의 변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점에서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A2로 인해 연구 참여 학생의 행동이 B1 이전의 저조한 수업참여 수준으로 급격히 회귀할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되었고, 이는 학생에게 좌절감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전 단계를 짧게 도입하였다.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권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편적 중재 자료 중 일부는 기대행동보다는 현실적인 학급 운영 맥락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않기’와 같은 규칙은 긍정적 진술이 아닌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PBS에서 강조하는 기대행동의 긍정적인 진술(예: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실제로 학급자치 시간을 통해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함께 제정한 학급 규칙을 활용한 것으로, 교육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대행동을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한 PBS를 통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계획할 때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일관된 지원을 제공했던 과정이 의미 있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가 이어지고,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